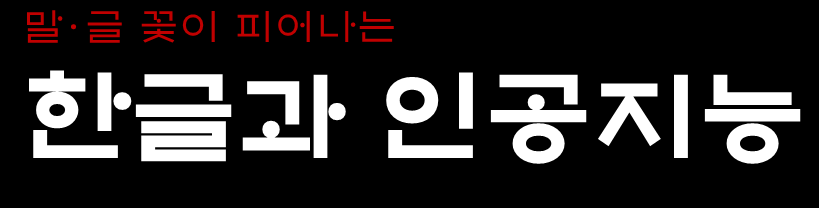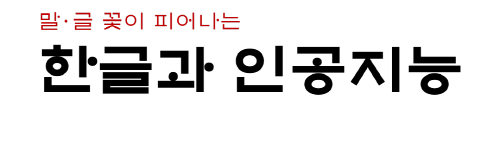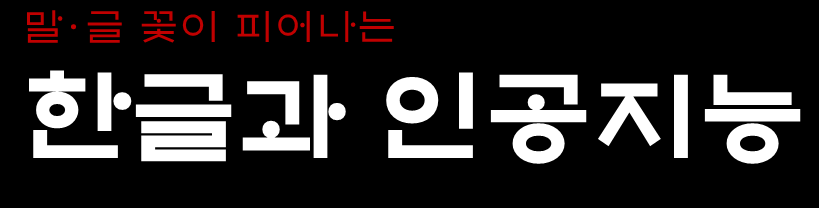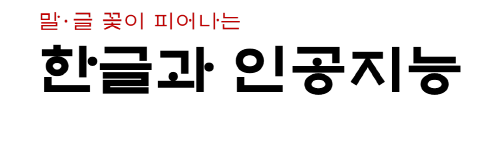― 겉말 너머에서, 삶의 결을 따라 피워낸 새말 이야기
우리는 말과 말을 주고받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작 우리 입에 익은 많은 말들이 낯선 땅에서 건너온 겉말인 경우가 많다. ‘건강한 밥상’이라 하면 될 것을 ‘헬시푸드’라 부르고, ‘함께 배우는 자리’라 할 일을 ‘워크숍’이라 이름 붙인다. ‘이름을 빚는 일’도 ‘브랜딩’이 되고, ‘한 가지 일을 함께 꾸리는 것’도 ‘프로젝트’라는 외딴 이름으로 불린다.
이 말들은 모두 편리하다. 하지만 때로는 삶의 숨결이 닿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묻는다. 이 말을 굳이 빌려 써야 할까? 혹시 우리 안에도 더 깊고 따뜻한 말이 숨어 있지 않을까?
〈한글 틔움〉은 그런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이 지면은 단순한 순화운동이 아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말에 몸의 감각과 마음의 결을 다시 불어넣는 일이다. ‘브랜딩’이라는 말보다 ‘이름을 빚는 일’이라고 말하면 그 속엔 한 사람의 뜻과 품, 그리고 빛이 담긴다. ‘워크숍’이라 부르기보단 ‘살림마당’, ‘배움자리’라 하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 삶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는 시대, 말도 함께 기계처럼 딱딱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말로 살고, 말로 관계를 짓는 존재다.
그래서 〈한글 틔움〉은 오늘도 다음과 같은 새말들을 틔워본다. ‘인공지능’이라 불리는 존재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려 하지만, 그저 ‘지혜 닮은 벗’, 혹은 ‘뜻 사람’이나 ‘새롭게 살아 있는 손길’ 정도로 부르는 것이 더 온당하지 않을까?
‘크리에이터’라는 말보다 ‘짓는이’, ‘피움이’라고 부르면 그 안엔 만들기의 기쁨과 관계의 감각이 함께 담긴다. ‘플랫폼’은 단지 기술 구조가 아니라‘터’요, ‘두레자리’다. 우리가 모이고 어우러지는 곳. 거기엔 기술보다도 먼저 공감의 질서가 있다.
한글은 이미 1446년 반포 당시부터 사람의 소리를 품고, 뜻을 드러내고, 관계를 이어주는 살결 같은 말의 옷이 되어주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다시 한 번 한글로 말의 숨을 틔울 수 있지 않을까?
낯선 말이 주는 세련됨보다, 익숙한 말이 주는 다정함을 선택하자. 말이 뾰족할수록 마음은 다친다. 그러나 틔운 말은 둥글다. 사람의 곁에 머무는 말은 늘 소리보다도 먼저, 눈빛과 숨결을 닮아 있기 때문이다.
<한글 틔움〉은 앞으로도 더 많은 낯선 말들 속에서 우리의 말씨, 우리만의 온도를 다시 꺼내어 말의 꽃밭을 피워갈 것이다.
김들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