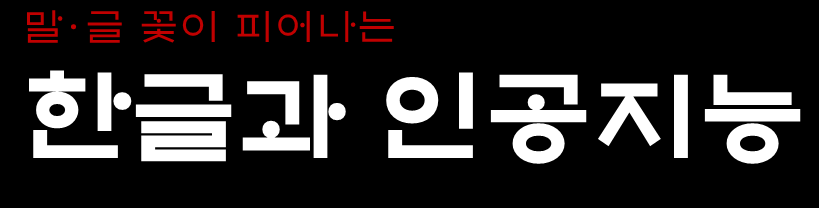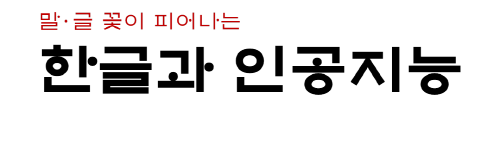― 생성형 인공지능의 시대, 우리는 여전히 말의 본질을 묻는다
요즘은 기계가 먼저 말을 건넨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화면 위에 뜬 그 말은 매끄럽고 정중하며, 때로는 감정이 담긴 듯 부드럽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인삿말이 오히려 마음을 어색하게 만든다. 그 말은 정확했고, 빠르고, 정답 같았지만, 어딘가 공허했다.
문장이었지만, 말은 아니었다. 기계는 이제 인간처럼 말한다. 언어모델은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단어의 패턴을 학습하고, 맥락에 맞는 문장을 구성하며, 필요한 감정을 흉내 낸다. 그러나 우리가 말이라고 여기는 것,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억 속에 남으며, 관계를 만들고 책임을 지는 그 진짜 말은 단지 문법적으로 완성된 문장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다. 말은 의미이고, 맥락이며, 숨이고, 결이다.
사람은 말하기 전 멈춘다.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마음속을 더듬는다. 어떤 말은 뱉는 데 하루가 걸리고, 어떤 말은 뱉지 않기로 마음먹는 데 몇 달이 걸리기도 한다. 그 망설임에는 감정이 있고, 역사와 관계가 있고, 말의 무게가 있다.
우리는 말하는 동시에 책임을 진다. 그 책임은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에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AI는 멈추지 않는다. 언제든지 말할 준비가 되어 있고,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대답을 던진다. 그 대답은 모범답안처럼 깔끔하지만, 그 안에 침묵이 없다.
말보다 중요한 침묵, 말의 여백, 말하지 않은 것들이 만들어내는 깊이, 그 모든 것은 AI가 아직 닿지 못하는 세계다. 나는 종종 인공지능에게 시를 써달라고 한다. 사랑에 대한 시, 외로움에 대한 단상, 우주를 바라보는 상념들. 인공지능은 그 요청에 잘 응답한다.
짧은 운율, 풍부한 형용사, 철학적인 말투까지 곧잘 흉내 낸다. 그 시는 얼핏 감동적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시는 나를 울리지 않는다. 왜일까. 그건 아마도, 그 말들이 아무것도 감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말에 감정을 싣는다. 그 감정은 경험에서 오고, 상처에서 오고, 기다림과 외면, 용서와 사랑 같은 삶의 축적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울컥하거나, 책의 한 문장에서 마음이 멎는 이유는, 그 말이 누군가의 존재 전체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은 말할 수 있다.하지만 말이 되기 위해선, 살아야 한다. 말은 누군가를 향해야 하며, 그 말을 건넨 사람이 그 말에 함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말은 아무리 유창해도,
아무리 시적이어도, 아무리 감정적 표현을 흉내 내더라도, 말이 아니다. 그건 텍스트일 뿐이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이 언어를 생성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질문은 “이 말은 정말 말인가?” 하는 물음이다. 우리는 AI가 만든 문장을 볼 때마다 감탄하지만, 그 말이 끝난 자리에 침묵이 남지 않는다면, 그건 사람의 말이 아니다.
우리는 말의 시대를 지나 말의 그림자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언뜻 보기엔 같은 말 같지만,
그 말에는 체온이 없고, 결이 없고, 책임이 없다. 우리는 그 차이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차이를 지켜야 한다.
〈너머의 말글〉은 그 지점을 지켜보는 창이다. 기계가 다다르지 못하는 언어의 심연, 그곳에 여전히 사람의 말, 사람의 존재, 사람의 감각이 살아 있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는 묻는다. “기계는 말할 수 있지만, 말이 될 수 있는가?” 그 질문이 사라지지 않는 한, 말은 여전히 사람의 것이다.
김들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