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성형 AI의 시대, 언어에 깃든 철학과 윤리를 재조명하다
“사랑은 감정의 깊은 바다와 같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우리는 각자 자신의 경험과 기억을 떠올리며 마음속에 사랑의 풍경을 그린다. 누군가는 잔잔한 호수를, 누군가는 거친 파도를, 또 다른 누군가는 따스한 햇살을 생각할 것이다. 이처럼 언어는 단순한 기호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경험, 그리고 사유의 층위가 쌓여 만들어진 ‘의미의 그릇’이다.
그런데 이제 이 그릇을 빚는 데 인간의 손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의 손길이 더해지고 있다. 인공지능은 “사랑”이라는 단어와 가장 높은 확률로 연결되는 단어들을 조합하여, 논리적으로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이 문장에서 ‘마음’은 어디에 머무는가? 인공지능은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만, 사랑을 ‘느끼지는’ 못한다. 이것이 바로 〈한글과 인공지능〉이 ‘마음글’ 섹션을 통해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챗GPT가 쓴 ‘효심’은 진짜 효심일까?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이나 윤리적 판단이 필요한 글쓰기에서 자유롭지 않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에게 “어머니께 보내는 감동적인 편지”를 써달라고 요청하면, AI는 수많은 편지 데이터 속에서 ‘사랑’, ‘감사’, ‘존경’ 같은 키워드를 조합해 유려한 문장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이 편지는 과연 ‘진심’일까?
이것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가 언어를 통해 쌓아온 **철학적 사유와 윤리적 판단의 문제**와 직결된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언어는 결국 ‘공허한 소리’에 불과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쓴 ‘효심’은 데이터를 통해 학습된 패턴일 뿐, 아들을 위해 평생 희생한 어머니에 대한 실제 경험과 감정이 담긴 ‘효심’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언어 주권과 책임, 그리고 ‘마음‘의 회복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우리는 언어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되돌아볼 필요가 생겼다. 우리가 생성형 AI에 의존하여 글을 쓸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기계에 위탁하는 것과 같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의 사유 능력을 퇴화시키고, 언어를 통해 세상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성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
‘마음글’은 바로 이 지점에서 언어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강조한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언어에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동시에 언어가 가진 사유의 깊이와 윤리적 무게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한글과 인공지능〉은 ‘마음글’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의 언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깃든 언어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도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독자들과 함께 이 질문에 답하며, 언어를 통해 인간의 존재 의미를 성찰하는 지적인 대화를 이어갈 것이다. 인공지능의 차가운 논리 속에서도 따뜻한 인간의 ‘마음’이 깃든 글을 찾아 나가는 여정, 이것이 바로 ‘마음글’의 지향점이다.
김들풀 기자 hang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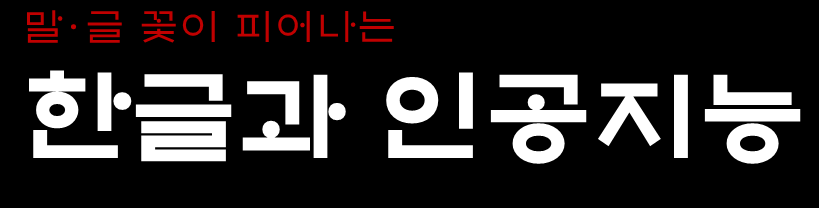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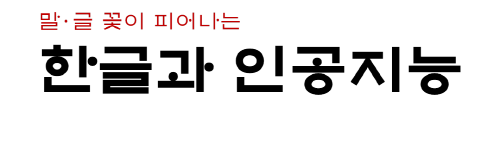
![[마음글] AI가 글을 쓸 때, ‘마음’은 어디에 머무는가](https://1446.co.kr/wp-content/uploads/2025/08/hearts-love-300x22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