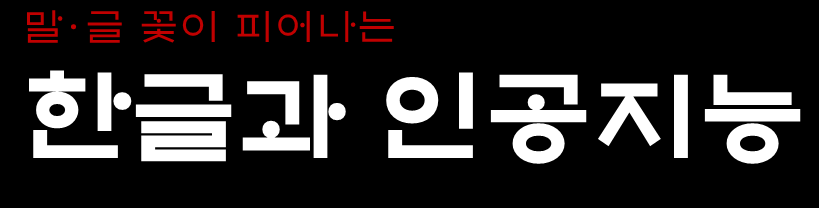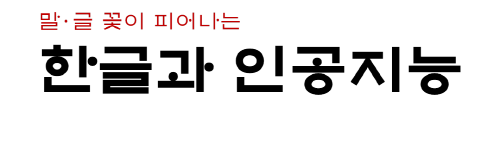― 여름날, 어르신의 말 한마디에서 피어난 말꽃
지난주, 고향 마을에 다녀왔다. 그날은 장마 직후의 맑은 날이었고, 햇볕은 무척 강했지만 마을 길에는 간간이 그늘이 드리워 있었다. 회관 앞 평상에 앉아 계시던 박ㅇㅇ 할머니는 부채를 슬쩍 접으며 내게 말을 건네셨다.
“거기 앉어. 여긴 그늘이 져서 덜 덥다.”
그 말이 어쩐지 마음을 건드렸다. 덥다는 건 똑같은데, ‘더위가 덜하다’는 말은 단순히 온도를 말하는 게 아니었다. 그늘이 있다는 사실보다, 그 그늘이 나를 살피고 있다는 느낌이 더 먼저였다.
“그늘이 져서 덜 덥다.”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고 지나가는 말들 가운데, 이토록 사람을 쉬게 하고, 마음을 식혀주는 말이 또 있을까.
내가 알고 있는 뉴스 언어는 대개 숫자나 차트, 혹은 긴장감을 키우는 어휘들이다. “폭염특보 발령”, “체감온도 35도”, “열돔현상”…
이런 말들은 정확하지만, 삶의 실감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그 수많은 ‘더위’ 가운데서도 단연코 살아 있는 말이었다. 그늘은 물리적인 현상이지만,
‘그늘이 져서 덜 덥다’는 말은 관계의 언어다.
누군가가 있어주어서, 그늘이 있어주어서, 그냥 조금은 살 만하다는 뜻이다.
어쩌면 언어란 그런 것이다. 기후가 아니라 감정의 온도를 다루는 기술. 우리는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이라는 문장을 백 번 들을 수 있지만, “오늘은 나무 그늘이 잘 드는 날이네”라는 말 한마디가 마음을 식혀준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많은 언어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다. ‘덥다’의 뜻을 알고, ‘그늘’이라는 단어를 통계적으로 조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늘이 져서 덜 덥다”는 말이 주는 정서적 완충, 관계적 배려, 계절을 품는 말의 속도를 과연 인공지능은 이해할 수 있을까.
나는 그날 이후 이 말을 자주 곱씹게 되었다.
“덜 덥다.”
‘덜’이라는 말에는 어떤 여백이 있다. 완전한 해결이 아닌 조금 나아지는 상태, 버티는 대신 견디는 힘, 온도계에 찍히지 않는 마음의 기후 변화가 들어 있다. 우리가 잃어버린 말들이 있다면, 그건 어려운 말이나 오래된 말이 아니다. 바로 이런 조심스러운 배려와 느림이 깃든 말들이다.
그늘은 어디에나 있다. 지붕 아래, 나무 아래, 담장 옆. 하지만 말 속에 드리운 그늘은 흔치 않다. 요즘 사람들은 자주 말한다.
“너무 덥다, 진짜 죽을 것 같아.”
그건 과열된 감정의 언어다. 반면 할머니의 말은 뜨거운 여름을 지나오며 쌓인 언어의 결, 삶의 기술, 몸과 마음이 익힌 온도 조절법이었다.
뉴스는 늘 최신을 말한다.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정보. 하지만 나는 생각한다. 진짜 뉴스는, 그늘 아래 누군가의 말 한마디일 수도 있다. 그 말은 느리고, 작고, 기록되지 않지만 어떤 순간엔 가장 크게 다가온다. 그날 할머니의 말 한마디가 나에게는 그 어떤 속보보다 소중한 말꽃이었다.
이 여름, 당신 곁에도 그런 말꽃 하나가 피어나기를 바란다. 말이 그늘이 되어, 마음을 조금은 덜 덥게 해주기를.
김들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