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시대, 한글의 문장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정신의 풍경
우리는 지금,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은 문장이 매일 수억 개씩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다. 0과 1로 이루어진 디지털 우주에서 인공지능은 텍스트를 읽고, 쓰고, 요약하고, 심지어는 새로운 문학 작품까지 창조해낸다. 기계가 글을 쓴다는 것. 이는 단순히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글쓰기’라는 행위에 대한 우리의 오랜 정의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사건이다.
과거, 글쓰기는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이었다. 펜 끝에서 흘러나오는 문장은 작가의 사유와 감정, 경험의 축적이었다. 글은 곧 사람의 ‘숨’이었다. 한 문장 한 문장에 작가의 호흡이 깃들어 있었고, 독자는 그 호흡을 따라가며 의미를 길어 올렸다.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통계적 확률에 따라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을 조합한다. 그 문장에는 ‘숨’이 있을까?
이를테면, 인공지능에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주면,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사랑은 감정의 깊은 바다와 같다”와 같은 문장을 생성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 완벽하고 문법적으로도 틀릴 것이 없다. 하지만 이 문장이 과연 작가의 심장에서 터져 나온 고백일까?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텍스트 데이터의 평균값에 가깝다. 작가가 첫사랑의 아픔을 겪고 밤새워 쓴 문장, ‘숨’이 담긴 문장과는 그 결이 다르다.
이것이 바로 〈한글과 인공지능〉이 집중하는 ‘글숨’의 본질이다. 글에서 태어나는 ‘정신’과 ‘문장 생성’ 사이의 경계. 인공지능이 아무리 정교한 문장을 만들어낸다 해도, 그 안에는 아직 인간의 고유한 ‘숨’을 담아내지 못한다. 고독, 슬픔, 환희, 그리고 사랑과 같은 인간의 복잡한 감정들은 단순한 데이터 조합만으로는 온전히 표현될 수 없는 영역이다.
우리는 이 경계에서 한글의 역할을 되묻는다. 한글은 단순히 소리를 기록하는 문자가 아니다. 소리 하나하나에 인간의 감정과 사유를 담아내는 섬세한 도구다. ‘가시버시’나 ‘애틋하다’ 같은 순우리말은 복잡한 정서를 단 하나의 단어로 응축해낸다. 인공지능이 이런 단어들의 통계적 용법은 알 수 있겠지만, 그 안에 깃든 문화적 맥락과 정서적 깊이까지 이해하고 글에 녹여낼 수 있을까?
인공지능 시대의 글쓰기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숨’을 담아내는 일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기계가 아무리 많은 문장을 쏟아내도,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작가의 고유한 경험과 사유에서 비롯된 한 문장일 것이다.
〈한글과 인공지능〉은 이러한 글쓰기의 본질을 탐구하며, 독자들에게 묻고자 한다.
“인공지능의 완벽한 문장들 속에서, 당신의 ‘숨’이 깃든 문장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한글의 문장들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인간의 문장이 가진 고유한 가치를 재조명할 것이다. 기계가 글을 쓰는 시대에, 오히려 인간의 글쓰기가 왜 중요한지, 한글의 문장들이 어떻게 우리의 정신과 문화를 담아내고 있는지 함께 고민하며 새로운 의미의 ‘글숨’을 찾아나갈 것이다.
김들풀 기자 hang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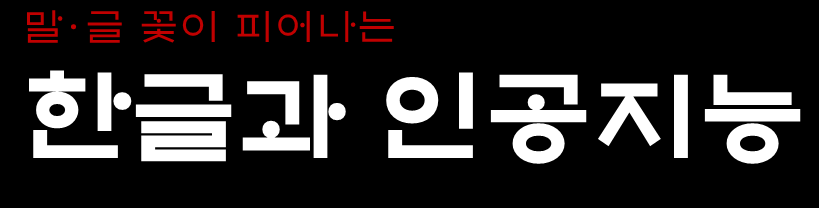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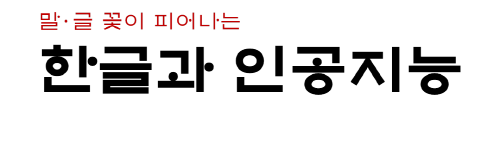
![[글숨] “한글, 0과 1의 세계에 글이 숨쉰다”](https://1446.co.kr/wp-content/uploads/2025/08/Gemini_Generated_Image_2wd8p42wd8p42wd8-300x300.png)